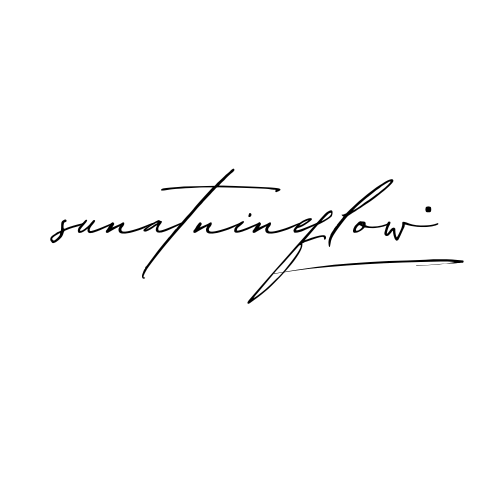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주말기록
- 조용한기록들
- 바쁜하루
- 직장인일상
- 감성블로그
- 여행준비
- 비오는날
- 여행계획
- 감정의흐름
- 티스토리
- 기다림의끝
- 오늘의감정
- 집정리
- 나를돌아보는시간
- 미쳐보자
- 소소한기록
- 햇빛결노트
- 나의이야기
- 여름아침
- sunatnineflow
- 블로그팁
- 주말일기
- 이사준비
- 일상블로그
- 아홉시의감정
- 감성루틴
- 베트남여행
- 감정기록
- 일상기록
- 햇빛결의노트
- Today
- Total
“sun at nine : 조용히 빛나는 나의 하루”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하지는 않다 본문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부모와 자식은 당연히 따뜻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예인 가족들의 기사를 보면, 잘나가는 자식 하나를 부모가 이용해 보증을 서거나 사기를 치고, 결국 자식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따뜻한 건 아니구나.’
내가 살아온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 난 연예인도 아닌데.
그럼에도 세상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네가 참아야지.”
“부모 욕하는 건 불효야.”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간 마음을 다쳐왔는지를.
어제는 또 이런 기사를 봤다.
이제는 부모들이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부모가 아프거나 간호가 필요할 때, 나서는 건 대부분 딸들이었다.
아들들은 한 발 물러서거나, 아예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보고 겪은 현실은 분명 이랬다.
더 억울한 건, 정작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줄 때는 아들에게 더 기울어진다는 사실이다.
간호하고, 곁에서 버티고, 끝까지 책임지는 건 딸인데도 말이다.
내 엄마의 선택 역시 늘 아들에게 향해 있었다.

나이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똑같다.
아들은 더 많이 받고, 딸은 더 많이 헌신하는 구조.
이게 성차별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겐 단순한 주장이나 억측이 아니라, 뼈저리게 겪어온 현실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 무겁다.
책 속에서처럼 따뜻하기만 한 관계가 아니다.
책임과 불평등이 얽히고, 사랑보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니들이 내 삶을 알아?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잃어야 했는지, 정말 알고 하는 말인가?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다치지 않겠다고.
가족이라는 틀이 내 삶을 흔든다면, 그 틀 너머에서라도 나를 지켜내겠다고.
'아홉시의 감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추석을 앞두고 드는 생각들 (2) | 2025.09.17 |
|---|---|
| 소소한 변화 (2) | 2025.09.08 |
| 인간관계에 대한 요즘의 생각 (6) | 2025.08.26 |
|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에, 영화제 추억이 떠오른 하루 (8) | 2025.08.19 |
| 알고 싶지 않은데, 보이는 것들 (12) | 2025.08.13 |